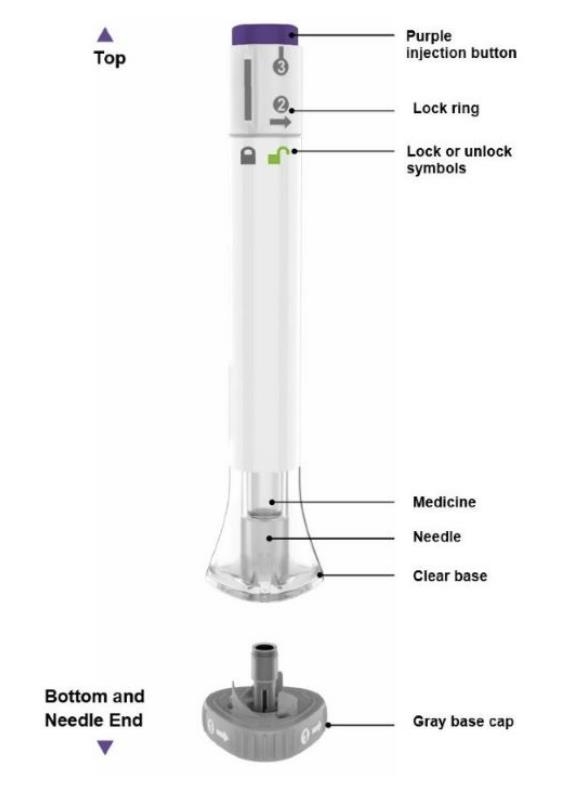![<strong>아토피 피부염</strong><br>
[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www.hmj2k.com/data/photos/20251147/art_17637857547524_18508a.jpg?iqs=0.550365293829603)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염증이 생겨 오랜 시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이다.
가족력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유해 화학 물질, 환경오염 물질 증가 등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간 복잡한 상호작용이 원인이 돼 발생한다.
그 중 면역학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이토카인(면역체계에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단백질 분자)이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IL(인터루킨)-13, 4, 31 등 사이토카인을 우선적으로 생성하는 2형 보조 T세포(Helper T-cells·다른 면역 세포가 감염과 싸우도록 신호를 보내는 역할)의 조절 장애가 아토피피부염의 주요 면역학적 원인으로 꼽힌다.
◇ 중증 아토피염 한해 192일 재발…혁신 신약 등장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더 빈번하고 긴 재발을 경험하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192일 동안 증상이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성적인 가려움증과 수면장애는 중증 환자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야간에 심해지는 가려움증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주된 수면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눈꺼풀 피부의 염증과 자극으로 인한 눈꺼풀 피부염과 각결막염 및 백내장 등 합병증도 부담이 된다.
2024년 한국아토피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전신 치료 방법으로는 기존 전신 약물(Conventional systemic drugs)과 생물학적 제제(Biologics), JAK 억제제(JAK inhibitors)가 있다.
생물학적 제제는 아토피피부염과 관련한 특정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반면, JAK 억제제의 경우 JAK/STAT(Janus kinase/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신호 전달 경로에 작용해 아토피피부염 관련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광범위한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한다.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생물학적 제제는 레브리키주맙, 두필루맙, 트랄로키누맙이 있으며, JAK 억제제로는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이 있다.
글로벌 과학기술 정보 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의 '2025년 블록버스터 신약(Drugs to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레브리키주맙은 2030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실적이 기대되는 11개 의약품 중 하나로 선정됐다.
수용성 인터루킨-13을 표적으로 하는 고친화성 면역글로불린(IgG4) 단일클론 항체인 엡글리스가 대표적 레브리키주맙 신약으로, 주요 3상 임상 시험 'ADvocate-1', 'ADvocate-2'을 통해 빠른 피부 병변 개선을 확인했다.
◇ 치료제간 표적 물질 등 달라…동일계열 교체투여 확대 필요
현재 국내에서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치료제 간 교체투여 관련 급여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생물학적 제제나 JAK 억제제 계열 치료제를 처방받던 환자가 다른 치료제로 변경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3월부터 다른 계열로의 교체투여(생물학적 제제→JAK 억제제, JAK 억제제→생물학적 제제)에 한해 급여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동일 계열 내에서의 교체투여는 여전히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같은 생물학적 제제라도 표적하는 물질과 작용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제 내 교체투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정은 교수는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등 다양한 신약이 등장하면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있다"면서도 "아토피피부염은 환자마다 증상 양상과 치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지만 현재 동일한 주사제 계열 혹은 경구 약제 내에서 약제를 변경할 경우 급여 제한으로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환자들을 위한 보다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