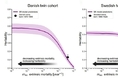![청소년 남학생 [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41249/art_17330919070551_91416d.jpg)
#1. 초등학생 A양은 학교 지각과 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
가족과 대화도 거부하고 오직 글로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가 하면 우울 증상으로 자해 행동까지 보였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A양 사례를 인지하고, A양 어머니에게 조속한 치료와 개입이 시급한 상황임을 전달했다.
#2. 중학생 B군은 학교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일삼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진단받은 '관리 대상'이다.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서 부모의 갈등에 장기간 노출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B군 스스로는 심리·정서 상담을 받고 나아지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등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B군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설명에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했다.
이 때문에 학교 역시 B군을 더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3. 또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C군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환청·환시에 시달리고 가출을 하는 등 위기 징후를 보였다.
주양육자는 부모가 아닌 이모였으나 이모가 외부 개입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고수해왔다.
C군의 상태는 더욱 악화했다.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환청·환시도 더욱 심각해졌다.
학교 측은 이모를 계속해서 설득해 결국 1년 만에 C군의 종합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받은 C군은 약물·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정서 건강을 회복하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사례는 지역교육복지센터에 보고된 내용 중 보호자 거부로 학생 지원이 어려운 경우를 각색한 것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처럼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문제 등이 복합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임에도 보호자의 무관심과 거부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 등에서 상담을 지원해줄 수 있으나 의료 등 전문기관의 개입을 위해선 보호자 동의가 필수적인 현행 제도 탓이다.
교육부는 이에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안'에 '긴급 지원' 조항을 추가해 입법을 시도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안은 기관별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적합한 여러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동의만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 등을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선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 없이도 여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긴급 지원의 골자였다.
그러나 이 조항이 보호자 친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혀 결국 삭제된 채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학교 현장에선 긴급 지원 조항이 빠져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지역 중학교 상담교사인 성나경씨는 "병원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호자들께 전해도 안 가시는 경우가 많다"며 "중증도의 정신과 약을 먹으면 멍해지는 부작용이 있다 보니 자녀 공부를 위해 약을 못 먹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성씨는 "입학할 때 똘망똘망하고 반짝이던 눈을 가진 아이들이 망가져 가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위기 학생들에게 조기에 개입하면 대인관계, 삶의 질, 기능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긴급 지원 조항을 제외한 법안 통과를 우선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추후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긴급 지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이 이뤄지려면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동 학대 등 부모 동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위기 상황 때 학생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